“글 쓰는 건 쉽다. 그냥 타자기 앞에 앉아서, 정맥을 열고 한 방울씩 피를 흘리기만 하면 된다.”
레드 스미스(Red Smith)의 말이다. 글을 쓸 때는 핏방울을 떨어뜨리듯이 한 글자씩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세상을 떠나던 해(1982년)까지 55년 동안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며 이 말을 철저히 지켰다.
그의 글은 세련된 어휘와 타고난 유머 감각이 특징이어서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의 에세이와 함께 대학 교재에 실렸다. 글을 통해서 미국의 스포츠 팬을 어떻게 열광시켰는지 그가 몸담은 뉴욕타임스(NYT) 기사 등을 통해 알아봤다.

본명은 월터 웰즐리 스미스(Walter Wellesley Smith)다. 1905년 9월 25일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붉은 머리색 때문에 벽돌(brick)이라는 별명으로, 대학에 가서는 ‘빨간색(red)’으로 불렸다.
본명보다 레드 스미스라는 별명을 더 좋아해서 필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빨간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될 때까지 ‘레드 스미스’로 남았다.
스미스는 노트르담대를 졸업한 1927년에 신문기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문사 100여 곳에 일자리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NYT에서만 왔다. 거절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여러 차례 낙방 끝에 밀워키센티넬(The Milwaukee Sentinel)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첫 직장에서는 스포츠와 관련 없는 범죄나 지역 소식을 취재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몇 주간 일을 배웠다.
신문기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스미스는 어떤 면에서 다른 이들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동료 기자였던 아이라 버코우(Ira Berkow)의 책 <레드 스미스 전기(Red: A Biography of Red Smith)>에서 스미스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직접 밖에 나가서 납치범과 아이를 찾을 수 있는(who could go out and find the kidnapper and the child)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대신 정확한 단어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 골몰했다.”
스미스는 가장 좋아하던 작가 중 한 명인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명언을 따랐다. “거의 옳은 단어(the nearly right word)와 완전히 옳은 단어(the right word)의 차이는 반딧불이와 번개의 차이와 같다.”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단어로 완벽한 문장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다.

1년 뒤, 스미스는 세인트루이스스타(The St. Louis Star)에서 교열을 담당한다. 아이라 버코우의 NYT 기사(1982년 1월 16일자 1면)에 따르면 스미스는 반복되는 교열 작업이 싫증 났지만 매일 책상에 올라오는 엉망진창의 원고를 보며 충격을 받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됐다.
몇 달 뒤에 스포츠 기자 6명 중 3명이 해고됐다. 레슬링 경기 관계자에게 홍보를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계기로 스미스는 스포츠 기자가 되라는 제안을 받았다. 첫 취재는 야간에 열린 미식축구 경기였다. 풋볼 경기장의 거대한 조명을 질투하는 반딧불이 입장에서 칼럼을 썼다.
문체는 최대한 간단하며 직관적이었다. 스포츠 기자가 스포츠 팬인 독자에게 흥미를 선사하며 스포츠의 우아함, 아름다움과 유머를 담은 글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36년 필라델피아레코드(The Philadelphia Record)를 거쳐 1945년에 뉴욕헤럴드트리뷴(The New York Herald Tribune)에 입사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마침내 그가 바라던 뉴욕에서 일하게 됐다.
뉴욕헤럴드트리뷴에서 연재한 ‘스포츠의 관점(Views of Sports)’ 칼럼은 미국 전역에서 읽혔다. 명성을 쌓은 스미스는 1971년 10월 8일, NYT 칼럼니스트로 합류했다. 그의 나이 66세였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기자 지망생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냈던 NYT에 한국 같으면 정년이 지난 나이에 입사했다. NYT에 따르면 스미스가 1주일에 서너 번씩 기고한 칼럼은 미국의 신문사 275곳은 물론 30개국 신문사 225곳에 실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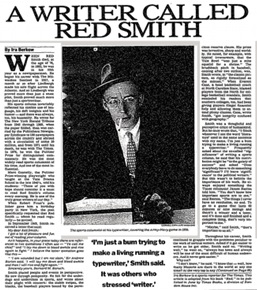
스포츠 저널리즘 분야의 원로로서 스미스는 경기 내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의 칼럼에 그치지 않았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죽어가며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평소 지론에 따라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선수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 구단은 소속 선수에 대해 아주 강력하며 독점적인 권한을 가졌다. 계약 기간의 트레이드는 선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계약이 끝나도 선수 소유권을 구단이 갖고 있어서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하기 힘들었다.
스미스는 ‘노예 거래의 성황(Lively Times in the Slave Trade)이라는 칼럼(NYT 1972년 4월 21일자 29면)에서 프로야구 리그의 노사관계를 노예와 주인으로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운동선수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MLB의 최초 노조 위원장(마빈 밀러‧Marvin Miller)는 저서 <완전히 달라진 상황(A Whole Different Ball Game)>에서 “레드 스미스는 그 시대의 다른 스포츠 기자들과 굉장히 달랐다”고 회상했다. 스미스가 질문을 할 때면, 세간의 선입견과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다.
스미스는 에이버리 브런디지(Avery Brundage)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부고를 전하는 칼럼(NYT 1975년 5월 12일자 48면)에서 재임 기간에 보였던 정치적 이중잣대와 오만함, ‘프로 선수들은 절대 올림픽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아마추어리즘 정신을 비판했다.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스미스는 1976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스포츠 기자로서 두 번째였다. 퓰리처 위원회는 그의 논평이 박식하고 문학적 자질이 뛰어나며 관점의 신선함에 있어서 독특하다고 언급했다.
스미스는 1982년 1월 15일 울혈성 심부전으로 눈을 감기 직전까지 글쓰기의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칼럼은 1982년 1월 11일자였다. 제목은 <Writing Less - and Better?>였다.
이 글에서 그는 주 4회 연재하던 칼럼을 3회로 줄이게 됐다며 글의 품질이 더 나아질지는 함께 지켜보자고 당부한다. 그리고 대학에 갓 입학한 딸과 나눈 대화를 옮기며, 칼럼을 1주일 내내 쓰던 시절부터 6회, 5회, 4회, 3회… 차근차근 줄어든 과정을 추억한다.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다 됐지만 레드 스미스의 이름은 미국 곳곳에서 아직도 기억된다. 스미스가 태어나고 자란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는 그의 이름을 딴 학교(Red Smith School)가 1999년 설립됐다.
모교인 노트르담대는 스미스 사망 직후인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저널리즘 강의(Red Smith Lecture)를 통해 저명한 저널리스트와 작가를 대상으로 글쓰기 방법과 미국 저널리즘을 교육했다.
미국의 스포츠신문편집인협회(APSE‧Associated Press Sports Editors)는 1981년부터 ‘레드 스미스 상’을 만들어 미국 스포츠 저널리즘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스포츠 기자에게 해마다 수여한다.

